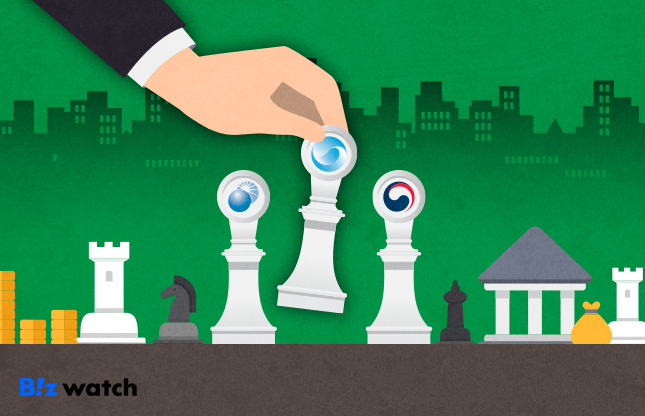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입니다.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총재의 발언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한은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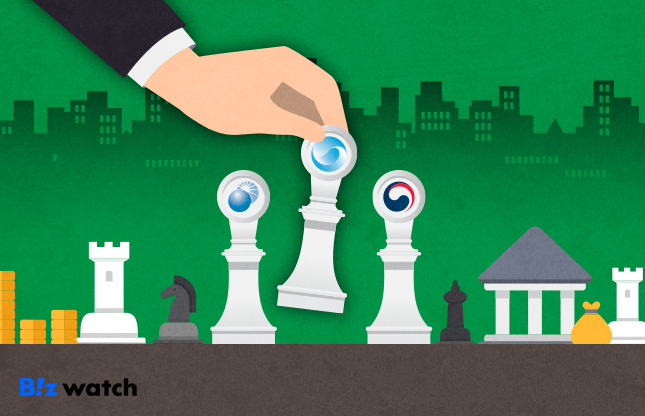
최근 한은은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 과정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기관을 단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독 권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돌이켜 보면 거시 정책·미시 감독권 이관을 주장한 한은 노동조합의 주장은 티져(teaser·호기심을 자아내는 사전 광고)였던 겁니다.▷관련기사 : [현장에서]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속도…한은 숟가락 얹기?(6월18일)
한은이 감독권 확대를 요구하는 건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명분에 기반합니다.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필요 시 금감원과 공동으로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감독 권한을 잃은 한은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졌죠. 이는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 판단에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국 중앙은행 상당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감독 권한을 중앙은행에 두고 있다고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감독권을 누가 쥐느냐는 곧 금융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해석 권한, 즉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의 정책 철학이 금융사들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은이 통화 긴축 시그널을 줘도 금융사 입장에선 참고사항 수준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기에 은행들은 한은 뜻과 달리 대출을 늘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총재가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죠.
감독권과 제재권을 함께 쥔 금융위와 금감원의 발언은 금융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금감원 말 한마디는 사실상 법에 가깝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제재, 과태료, 인허가 불이익 등 실질적 리스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 검찰'이라 불리는 이유이죠.
가깝게는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가 겪은 '고초'는 감독기관이 금융사 행보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결국 공은 국정위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한은까지 참전하며 향후 국정위의 판단이 금융감독체계의 권한 배분은 물론 통화정책의 실효성까지 좌우할 전망입니다.